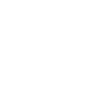new 새 여행기 작성
새 여행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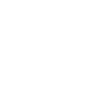
지난밤 숙소로 도망가는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 소식을 접했던 동해 지역에는 다음날 SNS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풍으로 텐트가 부서지는 일이 꽤 있기 때문에 해파랑길을 백패킹으로 걷는다면 이렇게 날씨 체크는 꼭 하는 게 좋다. 나는 외로움 속 아침 저녁으로 들은 라디오가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어 외로움과 날씨 예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밤의 폭우와 강풍 덕분일까? 새파란 하늘아래 울진군의 바다는 역대급 청명함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동안 자고로 투명한 바다는 제주도가 최고고 짙은 푸른 빛의 깊은 바다는 동해안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동해안은 주로 강원도를 뜻했고 강원도 중에서도 좀 더 위쪽인 속초나 양양 그리고 고성군이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강원도 남부를 지나 경상북도까지 넘어와서 강원도의 고성군만큼 깊은 푸른빛 청명한 바다를 볼 수 있을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다.
뭐랄까. 그냥 지나만 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푸른빛이라고 해야할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울진군이다. 여행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해파랑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바다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울진이라고 대답할 것 같다. 그만큼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 처럼 놀랍고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훗날 만난 아내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걸으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공감을 했었기 때문이다.
영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울진군 답게 울진 대게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항구마저 아름다운 울진군의 푸른 빛. 바다를 충분히 즐기다보니 어느새 이날의 도착점으로 설정한 한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구한해수욕장 혹은 야영장. 캠핑장 뒤에 공동묘지가 있긴 했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으로 시설이 괜찮아보였다. 성수기에는 돈을 받고 사용할 수 있는지 전기도 있었고, 개수대와 화장실 등 시설이 좋은 편에 속했다. 내가 갓던 봄철은 아직 해수욕장 개장을 하기 전이기에 전기나 개수대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화장실은 사용이 가능했다. 화장실만 있어도 씻고 볼 일을 볼 수 있기에 이정도면 최고의 숙박지에 가까웠다. 오랜만에 모래가 아닌 야영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날은 야영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다음날, 다시금 시작한 해파랑길에서는 지난 망양정에 이은 또 다른 관동팔경 중 하나인 월송정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뭔가 이곳은 인위적인 느낌이 강했다. 공사 중인 것도 있었지만, 뭐랄까. 너무 판을 키우는 느낌이 드는 장소였다.
신라시대의 화랑들(永 ·述 ·南石 ·安祥)이 이 곳의 울창한 송림에서 달을 즐기며 선유(仙遊)하였다는 정자이다. 관동8경(關東八景)의 하나로, ‘月松亭’이라고도 쓴다. 명승을 찾는 시인 ·묵객들이 하나같이 탄복한 곳이라고 한다. 정자는 고려시대에 이미 월송사(月松寺) 부근에 창건되었던 것을 조선 중기 연산군 때의 관찰사 박원종(朴元宗)이 중건(혹은, 그가 창건하였다고도 함)하였다고 하며, 오랜 세월에 퇴락한 것을 향인(鄕人)들이 다시 중건하였으나 한말에 일본군이 철거해버렸다. 1969년에 재일교포들이 정자를 신축하였으나 옛 모습과 같지 않아서 해체하고 1980년 7월에 현재의 정자(정면 5칸, 측면 3칸, 26평)로 복원하였으며, 현판은 최규하(崔圭夏)의 휘호로 되어 있다. 관동8경을 꼽을 경우, 월송정 대신 강원 통천군 흡곡(歙 谷)에 있는 시중대(侍中臺)를 꼽는 이도 있다.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정보를 검색해보면 왜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는지 이해가 간다. 확실히 오래된 건물은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할까? 그러한 게 없을 경우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 같다.
이후에는 정말 긴 해안도로를 따라 걷게 되었다. 길을 잃을 걱정도 없고 잘 뚫린 길이다보니 정말 잡생각에 빠져 걷기도 했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거나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다 내 눈에 보인 것은 한쪽에 쌓인 박스였다.
문득 박스가 쌓여 있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처음엔 이 이질감이 뭔지 몰랐으나 다시마를 말리는 할머니를 보고는 떠올랐다. 사실 도시에는 저렇게 박스가 널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기 드물다. 오히려 도시에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이런 폐품들을 모으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풍요를 찾아서 모이는 도시. 사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이면에는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반면에 농어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니 과연 도시가 농어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의문이 들었다.
또 다시 나타난 울진 대게. 이정도면 영덕 대게의 명성이 억울한 심경으로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해파랑길은 후포 등대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갔고, 후포 등대 뒤로 올라와 이쁘게 꾸민 벽화 마을들을 지나 후포항으로 내려오니 이 게 장식물에 대한 이해가 단번에 갔다. 항구에는 온통 게와 관련된 식당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물론, 가난한 1인 여행자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야 했다.
반려견을 그대로 옮긴 벽화가 있는 집
강원도를 따라, 경상도를 따라 걷는 해파랑길. 계속해서 동해안을 따라 걷기 때문인지 주로 물회 혹은 회덮밥을 진짜 많이 먹게 되었다. 물론, 그만큼 내가 회를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마땅히 먹을 게 없는 경우도 많았다. 항구 혹은 해변은 주로 관광지에 가깝기 때문에 지역 특산물 위주의 식당이 많았고, 그만큼 해산물이 주로 되는 식당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포항을 조금 지나서는 큰 항구 답게 일반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럴 때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어쩌면 일시 종주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일반식이 너무 그립고 , 집밥이 더 그리운 현상이 찾아오는 일시종주 해파랑길 백패킹이다.
오랜만에 먹는 일반식은 뼈해장국으로 오랜만에 뜨끈하고 얼큰하고 든든한 국밥을 먹을 수 있었다. 새삼스럽게 한국을 여행 중이지만 집밥이 그립고 다양한 한식이 그리운 것이 마치 해외여행을 하는 기분이 묘하게 들기도 했다.
그후로 영덕군을 향해 울진군은 계속해서 멋진 바다를 선보였다. 해파랑길에서 바다가 보여준 색은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울진군이다. 어쩌면 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 유명하진 않지만 푸른 바다만을 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정말 울진군을 추천하고 싶다.